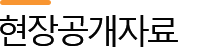지하철2호선 문양차량기지 건설부지 달성 문양리고분군 발굴조사
Ⅰ. 조사개요
가. 유적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30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1999. 8. 10~2001. 4. 1
1차조사 : 1999. 8. 10~2000. 8. 4
2차조사 : 2000. 8. 5~2001. 4. 1(예정)
다. 조사범위 : 약 18,000평
1차조사 : 12,300평
2차조사 : 5,700평
라.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院長 : 李白圭)
마. 조사의뢰기관 :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Ⅱ. 조사경과
大邱廣域市 達城郡 多斯邑 汶陽里 山30番地 일대에 위치하는 문양리 고분군은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이다. 이 유적은 문양리 일대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지하철2호선 문양차량기지 건설예정부지에 편입됨으로써 1998년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사의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대규모의 삼국시대 분묘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표조사 당시 능선의 정선부에 위치하는 봉토분은 도굴로 인해 크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이후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3개 지구(Ⅰ~Ⅲ지구)에 대한 시굴조사를 1999. 3월~4월까지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현재 발굴조사중인 Ⅰ지구에서 분묘유적이 약 18,000평 정도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 발굴조사 대상지역의 1차조사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Ⅲ. 유적의 입지와 고고학적 환경
문양리고분군은 대구-성주간 국도변에 위치하는 야트막한 야산(60m~75m)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적에서 남쪽으로 1km 거리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主陵線은 남동-북쪽으로 뻗어있으며, 주능선의 정상부에는 2~3열로 20여기(시굴조사 당시는 약 40여기 정도로 추정)의 삼국시대 봉토분이 조영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의 경사면으로는 삼국시대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횡혈식석실분, 그리고 고려 및 조선시대 분묘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의 주변에는 죽곡리 고분군(산성), 문산리 고분군(산성), 봉촌리 고분군 및하산리성지 등이 분포하고 있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문헌은 <三國史記> 地理志에 良州소속의 壽昌郡 河濱縣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하빈면과 다사면에 해당된다.
Ⅳ. 조사내용
1. 유구
지금까지 조사된 분묘는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봉토분 2기, 석곽묘 84기, 옹관묘 3기, 횡혈식석실분 1기, 기타 2기, 고려, 조선시대 분묘 16기, 기타 1기 등 총 133기이다.
봉토분을 제외한 목곽묘 및 석곽묘들의 분포는 대체로 능선의 경사면에 조영되어 있다.
목곽묘는 주능선 및 서쪽사면, 그리고 석곽묘는 유적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석곽묘의 경우 대부분 상부쪽에 호상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의 아래쪽으로는 1~2기의 석곽이 축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3~4기의 석곽이 축조된 경우도 조사되었다.
특히 하나의 溝 내부에 설치된 석곽의 경우 2기 중 아래쪽에 설치된 무덤이 先築(85호분보다 86호분이 선축)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부분 봉토의 유실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주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분포하는 봉토분들의 양상이 경사면에 설치된 석곽묘의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봉토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삼국시대 목곽묘
1) 7호묘
유적의 주능선 정상부 해발 약 66m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목곽묘이다. 묘광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N-67°-W이다. 황갈색 풍화암반층를 710㎝×228㎝×53cm정도 크기로 굴착하여 455㎝×100cm정도 크기의 主槨을 남동쪽에 설치하고, 그 북서쪽에 140㎝×113cm정도 크기의 副槨을 설치하였다. 목곽과 묘광사이에는 20㎝~50cm정도 크기의 자연석과 황갈색 점토를 충전하였으며, 주곽과 부곽 사이에는 10㎝~20cm정도로 비교적 작은 자연석과 황갈색 점토를 혼합하여 충전하였다. 주곽 바닥으로부터 5cm정도 높이에서 전면에 소토가 확인되며, 바닥에서는 아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의 북쪽으로 190cm떨어진 위치에 호상의 주구가 확인된다. 주구는 최대너비 300cm, 깊이 15cm 정도이며, 주구내부에서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주구 내부토를 제거한 바닥면에서 선축된 27호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주곽의 서단벽쪽에서 발형기대 1점, 단경호 4점, 연질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중앙부에서 철모 2점과 판성철모 4점이 출토되었다. 주곽의 동단벽쪽에서는 철모 1점, 철착 1점, 철부 1점이, 부곽에서는 단경호 6점이 출토되었다.
2) 20호묘
I차조사구역 주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하며 18, 19, 20호 3기가 평행하게 확인되었다. 묘광은 암반면을 평면 장방형으로 굴착하였다. 묘광의 크기는 316㎝×(잔존)98㎝×22cm이며, 목곽 288㎝×(잔존)80㎝×16cm 정도이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으며, 유구의 서장벽은 자연 경사와 후대의 교란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양단 부장을 하였는데, 북단벽에는 토기 5점, 방추차 1점을 부장하였으며, 남단벽에도 토기 1점을 부장하였다.
3) 27호묘
1차조사구역의 서사면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목곽묘이다. 유구는 점판암계의 청석암반층을 굴착하여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27호묘는 22호 석곽묘에 의해서 유구의 절반가량이 파괴된 상태이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추정)410㎝×130㎝×23cm, 목곽 (추정)370㎝×(추정)90㎝×(잔존)12cm이며, 유구의 내부에는 목곽 흔적으로 추정되는 적색의 점토가 동장벽 하단에서 관찰되었다. 목곽과 묘광사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남장벽에는 충진석으로 추정되는 점판암계 청석의 석렬이 관찰되었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유구의 중복으로 인하여 양단부장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서단벽에서 단경호, 연질발 등의 토기 6점 출토되었다.
4) 43호묘
1차조사구역 서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목곽묘이다. 유구는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44호 목곽묘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남서 모서리쪽이 자연경사로 인하여 유실되었고, 전신주 구덩이에 의해 동장벽 일부가 교란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388㎝×129㎝×17cm, 목곽 350㎝×92㎝×17cm이며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황갈색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충전하였다.
유물은 북단벽쪽에서 양이부호 1점, 단경호 3점, 철촉 3점, 철겸 1점, 중앙부에서 도자 1점, 토기편 2점이 출토되었다.
5) 117호묘
1차조사구역 주능선의 남쪽 서사면 상단부에 등고선 방행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목곽묘이다. 유구는 동북쪽 상단부에 50호 석곽묘와 거의 연접해 위치한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234㎝×(추정)95㎝×27㎝, 목곽 155㎝×(추정)56㎝×20㎝ 정도이다.
유구는 청석암반층을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내부에는 굴착시 나온 암반편과 황갈색 사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청석암반편을 혼합하여채웠다.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5 정도로 장방형이며 유구의 장축방향은 N-47°-W이다.
유구의 벽면은 지형의 자연경사로 인해 남장벽이 유실되어 정확한 묘광과 목곽의 범위는알 수 없었다. 유구의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원 지반인 청석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했다.
출토유물은 주로 서단벽에 치우쳐 부장되었는데, 파배, 호, 연질발 등 토기류 3점과 철부,도자 등 철기류 3점 등이 출토되었다.
나. 삼국시대 석곽묘
1) 8호묘
7호 목곽묘에서 북쪽으로 18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석곽묘이다. 묘광의장축방향은 N-75°-W로서 등고선과 나란하다. 황갈색 풍화암반층에서 확인된 유구는 평면 장방형이며, 묘광의 크기는 400㎝×146㎝×48cm이고, 석곽의 크기는 370㎝×60㎝×50cm이다. 석곽은 양장벽을 할석을 이용하여 평적하였으며, 단벽쪽에는 교란으로 인하여 벽석이 남아있지 않았다. 석곽의 내부에는 20cm~30cm정도 크기의 할석이 무질서하게 채워져 있었으며, 바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단벽 쪽에서 이식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침향은 동쪽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동단벽 쪽에서 유개고배 3점, 고배 2점, 개 2점, 대부호 1점, 단경호 2점, 철겸 1점, 철부 1점, 철촉 2점, 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서단벽 쪽에서는 유개고배 2점, 부가구연대부장경호 1점, 대부장경호 1점, 대부호 1점, 단경호 3점과 철부 1점, 철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중앙부에서 도자 1점, 철촉 1점이 출토되었다.
2) 13호묘
1차조사구역 주능선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묘광은 암반이 포함된황갈색 사질점토와 청석 암반층을 굴착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등고선방향과 행한다. 묘광의 크기는 406㎝×130㎝×62cm이며, 석곽은 330㎝×53㎝×62cm이다.
벽석은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벽축조 양상은 동장벽이 4~5단 정도 잔존하며 평적하였다. 상단은 종평적과 횡평적을 혼용하였으며, 그 아래로부터 하단까지는 횡평적하였다. 서장벽은 1단만이 잔존하며 횡평적하였다. 남단벽은 판석재 할석 1매를 수적하였으며 북단벽은 벽석이 유실되었다. 유물은 북단벽 쪽에서 토기 6점이 출토되었다.
3) 15호묘
1차조사구역 주능선의 서쪽 사면 상단부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석곽묘이다. 15호 석곽의 북쪽에는 16호 석곽묘가, 남쪽에는 17호 석곽묘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장축방향이 북서-남동인 N-19°-W이며, 규모는 묘광 265㎝×(잔존)105㎝, 석곽은 길이 225㎝ 정도이다.
주변 지형이 사질의 암반과 점판암계 청석암반층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15호 역시 이 암반층을 그대로 굴착하여 유구를 조성하였으며, 굴착시 나온 흙을 그대로 내부토로 사용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잔존하는 벽석의 형태로 보아 장방형의 유구이다.
벽석은 비교적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서장벽과 남․북 단벽이 모두 유실되었고, 현재는 동장벽만 잔존해 있다. 잔존하는 동장벽으로 보아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종․횡 혼용하여 평적하였는데, 현재 1~2단 정도만 남아있다. 벽석의 일부는 원 지형층인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유물은 북단벽 쪽으로 단경호, 고배, 연질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4) 36호묘
1차조사구역 서사면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이다. 유구는 점판암계의 청석암반면을 굴착하여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북단벽쪽이 자연경사로 인하여 유실되었으며 52호 목곽묘를 일부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유구를 중심으로 직경 850cm 정도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삭평하여 지형을 주변보다 높아보이게 한 후 청석암반면에 317㎝(잔존)×108㎝×42cm의 묘광을 파고, 230㎝(잔존)×65㎝×42cm 크기의 석곽을 축조하였다. 벽석의 축조는 남단벽에 1매의 판석조할석을 수적하였으며, 동장벽은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상부의 1~2단을 할석으로 평적하였다. 남장벽은 할석을 이용하여 평적하였다. 바닥에는 할석을 한 벌 깔아서 시상으로 이용하였으며, 남단벽쪽에서 이식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침향은 남향으로 생각된다. 유구의 동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호상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구의 규모는 길이 약 1,100cm, 너비 90cm, 깊이 36cm 정도이다.
유물은 북단벽쪽에서 고배 2점, 남단벽쪽에서 장경호 1점, 유개고배 2점, 파수부배 1점, 이식 1쌍, 중앙부 동장벽쪽에서 철촉 2점이 출토되었다. 주구내에서는 약간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5) 48호묘
Ⅰ차조사구역 남서사면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로 북쪽 상부에 주구를 갖추고 있다. 유구는 원 지표의 자연경사와 후대의 교란으로 인하여 북장벽 벽석의 대부분이 유구의 내부로 함몰된 상태이며, 남단벽은 후대의 자연배수로 인하여 완전히 유실된 상태이다.
48호는 원 지표면인 점판암계 청석암반층을 굴착하여 축조한 것으로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5 정도의 장방형 유구로 장축방향이 남동-북서인 N-48°-W이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잔존)375㎝×148㎝×52㎝, 석곽 (잔존)305㎝×60㎝×32㎝ 정도이다.
벽석은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주변의 다른 유구와는 달리 규모가 큰 할석을 사용하였다.
서단벽은 현재 4단 정도가 잔존하는데 모두 횡평적하여 상하 수직되게 면을 맞추었다. 동단벽은 유실되어 벽석의 축조 순서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 보아 서단벽이 양 장벽보다 먼저 축조되었다. 남장벽은 현재 3단 정도가 잔존하는데 50㎝ 정도의 비교적 큰 할석으로 횡평적하였다. 북장벽은 자연 경사와 토압으로 인하여 벽석의 대부분이 내부로 함몰되어 현재는 최하단석만 잔존한다.
유구의 바닥에는 특별한 시설없이 청석의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양단부장으로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파수부배 등 토기류 12점과 철겸, 철착, 철촉, 도자 등 철기류 7점 등이 출토되었다.
48호 주구는 석곽의 북쪽 상단부 전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자연경사에 의해 삭평되고 현재는 북서쪽 일부만 잔존해 있다. 주구의 (현) 깊이는 14㎝ 정도이며 내부에서는 호편이 출토되었다.
석곽의 남장벽 서쪽 상단 유구의 굴광선상에서 적색연질완 1점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매납레벨이 벽석 상단의 레벨과 큰 차이가 없으며 유물이 유구의 굴광에서 내부로 치우쳐 매납된 것으로 보아 석곽의 조성시 함께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6) 51호묘
Ⅰ차조사구욕 능선의 서사면에서 확인되며, 49호묘와 50호묘와 근접하여 위치한다. 묘제는 수혈식이고 암반면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310㎝×105㎝×45cm, 석곽 263㎝×40㎝×40cm 정도이다.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평적하였으며, 북동단벽과 북서장벽 대부분이 자연 경사로 인하여 유실되어 벽 축조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바닥은 생토면인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남서단벽 부분은 바닥면을 약 2~3cm정도의 높이차를 보이며 유물 부장공간과 주검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양단부장을 하였는데 남서단벽에는 유개고배, 개, 고배 등을 부장하였으며, 북동단벽에는 고배, 개, 유개고배와 함께 장경호가 부장되었다.
특히 남서단벽에서 이식과 두개골편이 노출되어 두향이 남서단벽임을 알 수 있었다. 유구의 서쪽에는 호상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주구도 대부분 유실되어 일부만이 확인되며,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주구내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7) 67호묘
Ⅰ차조사구역 능선의 서사면 말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Ⅱ지구와의 경계지점에 위치한다. 묘제는 수혈식 석곽묘로서 암반면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380㎝×123㎝×31cm, 석곽 (추정)340㎝×55㎝×27cm 정도이다.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나 남북단벽과 동서장벽 일부가 자연경사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바닥은 생토면인 암반면 위에 할석과 묘광 굴착시 나온 암반편을 이용하여 시상을 설치하였으며, 시상이 설치된 범위는 길이 220cm, 폭 55cm 정도이다.
유물은 남단벽에 유개고배와 고배가 부장되었으며, 시상대 위에 철촉 6점이 부장되었다. 북단벽에서는 내부조사시 토기편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양단부장을 한것으로 추정된다. 주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8) 82호묘
Ⅰ차조사구역 동쪽 능선의 동남사면 말단부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이다. 79호 옹관묘와 80호 석곽묘에서 남동쪽으로 약 1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유구는 81호 석곽묘에 의해 북장벽과 동단벽이 파괴된 상태이다. 유구는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파고서 축조하였으며, 규모는 묘광 350㎝×130㎝×45㎝, 석곽 275㎝×53㎝×5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7 정도인 장방형 유구로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인 N-67°-E이다. 벽석은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서단벽에서 동단벽쪽으로 오면서 유구의 묘광이 ‘ㄱ’형으로 넓어지는데 묘광이 좁은 서단벽 쪽으로는 작은 할석을,묘광이 넓은 북장벽 쪽으로는 큰 할석을 사용하여 세워쌓기 하였다. 북장벽은 2~3단 정도 잔존하는데, 상부 벽석과 묘광은 81호 석곽묘에 의해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다. 북장벽이 2~3단 정도 잔존하는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벽석의 레벨과 81호 석곽묘의 바닥면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82호 북장벽의 상부 벽석은 파괴되었어도 하부 2~3단 정도는 잔존하게 되었다. 남장벽은 북장벽과 같은 세로쌓기를 하였으며 1~2단 정도 잔존한다. 동단벽은 할석을 눕혀쌓기 하였으며 서단벽은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에는 시상을 설치하였는데, 북장벽 부분은 벽석축조 양상과 같이 묘광이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단벽에 유물이 부장되는 부분은 시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단벽에는 시상이 설치되어 있다.
유물은 양단부장으로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배신, 연질발 등 토기류 7점과 철모, 도자 등 철기류 4점 등이 출토되었다.
9) 85호묘
Ⅰ차조사구역 동쪽 능선의 동남사면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이다. 85호는 북쪽 상부에 호상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구의 남쪽 하단에 85호와 86호 석곽묘가 나란히 위치한다. 두 유구는 서단벽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85호의 남장벽 벽석상부에 86호 북장벽 벽석이 얹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86호가 선축되고 85호가후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구는 청석암반편이 다량 함유된 황갈색 점질층인 지표면을 굴착하여 축조한 것으로, 굴착시 나온 흙을 그대로 내부토로 사용하였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365㎝×132㎝×50㎝,석곽 287㎝×50㎝×55㎝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8 정도인 장방형 유구로 장축방향이 북동-남서인 N-47°-E이다.
벽석은 자연경사와 토압에 의해 벽석의 대부분이 유구 내부로 함몰되었다. 양 단벽은 모두 1매의 할석을 세워 놓았는데, 양 단벽 모두 상부에 1단의 할석을 판석 위에 올려놓았다. 북장벽의 경우 벽석이 유구내부로 내경된 상태로 약 5단 정도 잔존한다. 벽석은 주변의 암반을 떼어내어 사용하였는데 주로 횡평적하였으며 벽석 사이에 작은 할석으로 채워넣었다. 남장벽은 대부분 유구 내부로 함몰되어 현재 1~2단 정도만 잔존한다. 벽석 축조순서는 서단벽을 먼저 세워 놓은 후 북장벽, 서단벽, 남장벽 순으로 축조하였다.
석곽의 바닥에는 유물이 부장된 양단벽의 부장공간을 제외하고 전면에 10㎝ 내외의 할석으로 시상을 설치했다. 동단벽 쪽에서 이식 1쌍이 출토되었으며, 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침향은 동쪽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단경호 등 토기류 13점과 철겸, 철도자 등 철기류 2점, 이식 1쌍 등이 출토되었다.
10) 92호묘
Ⅰ차조사구역 동쪽 능선의 동남사면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이다. 92호는 북쪽 상부에 호상의 주구를 설치하였으며 주구의 남쪽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83호 옹관묘, 90호, 91호, 92호 석곽묘가 위치하며, 90호의 서단벽을 파괴하고127호 민묘(조선)가 위치한다. 92호는 북쪽 상부에 위치한 91호 석곽묘와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는데 유구의 축조방식으로 보아 상호 밀접히 관련된 유구로 보인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440㎝×170㎝×66㎝, 석곽 360㎝×65㎝×44㎝ 정도이다.
유구는 청석의 암반이 섞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그대로 굴착하여 조성한 것으로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6 정도의 장방형 유구로 장축방향이 북동-남서인 N-65°-E이다. 벽석은 양 단벽 모두 대형의 할석 1매를 각각 세워 놓았으며 양장벽은 모두 할석을 사용하여 종횡 혼용하여 쌓았다. 단벽의 경우 서단벽과 동단벽의 길이비가 약 1:1.5 정도로 동단벽이 서단벽에 비해 큰 할석을 세워 놓았는데, 단벽을 먼저 세워 놓고 장벽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구의 평면형태는 동쪽이 넓고 서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장벽의 경우 자연경사와 토압에 의해 벽석의 상단석 대부분이 유구 내부로 함몰된 상태였으며, 현재는 약 3~4단 정도만 잔존한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북장벽을 보면 동서쪽으로는 최하단석부터 2~3단 정도는 비교적 큰 할석을 횡평적하여 쌓았으나 중앙부로 올수록 벽석의 크기는 작아지고 종횡 혼용하여 쌓았다.
석곽의 바닥에는 유물이 부장된 양 단벽의 부장공간을 제외하고 전면에 약 10~30㎝ 정도의 할석으로 시상을 설치했으며, 동단벽쪽에서 이식 1쌍이 출토된 점으로보아 침향은 동쪽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양단부장으로 유개고배, 유개대부장경호, 단경호 등 토기류 18점과 철도자, 철촉 등 철기류 3점, 이식 1쌍 등이 출토되었다.
11) 94호묘
유적 동쪽 능선의 정상부, 해발 약 53m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석곽묘이다. 청석암반층 사이에 형성된 약간의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된 유구의 장축방향은 N-67°-E로서 등고선과 나란하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436cm, 너비142㎝~173cm, 높이 62㎝로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진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30cm, 너비는 상부 48cm, 바닥 55cm, 높이 64㎝로서 약간 내경하게 쌓았다. 벽석은 양장벽을 할석을 이용하여 평적하였으며, 양단벽은 판석을 이용하여 수적하였다. 바닥에는 20cm정도의 할석을 한 벌 깔아서 시상으로 이용하였으며, 유물이 부장되는 공간인 양단벽쪽은 아무런 시설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식이 서쪽 에서 출토된 점으로 보아 침향은 서쪽으로 생각된다. 묘광에서 북서쪽으로 190cm 떨어진 위치에 호상의 주구가 설치되었으며, 규모는 폭 120cm, 깊이 15cm 정도이다. 유물은 심하게 도굴되어 원래의 상태를 알 수 없으나, 양단부장으로 고배 1점, 유개고배 1점과 도자 1점과 철겸 1점, 이식 2점이 출토되었고, 주구 내부에서는 고배와 호 등의 토기편등이 출토되었다.
12) 22호묘
Ⅰ차조사구역 주능선의 남쪽 능선상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이다. 22호는 27호 목곽묘를 파괴하고 설치되었으며 북서쪽 약 3m 지점에 21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유구는 점판암계 청석암반층을 굴착하여 축조한 뒤, 굴착시 나온 암반편과 황갈색 사질토로 내부를 채웠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 277㎝×97㎝×27㎝, 석곽 (추정)230㎝×47㎝×3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8 정도로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이 남동-북서향인 N-47°-W 이다.
벽석은 현재 양단벽이 모두 유실된 상태이며 양장벽 또한 부분적으로 유실된 상태로 1~2단 정도만 잔존한다. 벽석은 할석과 암반을 떼어낸 청석을 종횡 혼용하여 평적하였다.
바닥에는 10~20㎝ 정도의 비교적 편평한 점판암계 청석을 시상석으로 설치했다. 시상은 서단벽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깔았는데, 유물은 양단부장의 형태로 동단벽의 경우 시상석 상부에 유물을 부장하였으나 서단벽에는 원 지반의 암반위에 유물을 부장하여 서단벽의 유물 레벨이 바닥 시상석의 레벨보다 낮다.
출토유물은 서단벽에서 유개고배, 단경호, 연질발이 동단벽에서 대부완, 대부잔, 방추차, 철환 등이 출토되었다.
13) 109호묘
Ⅰ조사구역 동쪽 능선의 남사면 하단부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삼국시대 수혈식 석곽묘이다. 109호는 북쪽 상부 약 4m 지점에 108호 석곽이 위치한다.
유구는 풍화암반층의 자연 암반면을 굴착하여 축조한 것으로, 유구의 규모는 묘광 279㎝×121㎝×24㎝, 석곽 (추정)250㎝×60㎝×27㎝ 이다.
평면형태는 묘광의 장단비율이 1:2.3 정도의 장방형 유구로 장축방향이 북동-남서인 N-78°-E 이다.
벽석은 자연경사에 의해 서단벽과 남장벽이 유실된 상태이다. 특히 유구의 중앙부로 후대의 자연배구로가 형성되어 벽석의 유실이 심하다. 벽석은 자연 암반층을 떼어내어 사용하였는데 동단벽은 얇은 판석조 할석을 세워 놓았다. 북장벽의 경우 현재 1~3단 정도가 잔존하는데, 북쪽 장벽은 약 3단정도, 남쪽 장벽은 1단 정도 잔존하며 중앙부는 자연배수에 의해 유실되었다.
유구의 바닥에는 암반을 떼어낸 비교적 편평한 할석을 깔았는데, 바닥의 서쪽부분은 모두 유실되고 동쪽부분만 남아있다.
유물은 양단부장으로 추정되나 서단벽쪽의 심한 유실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동단벽쪽에서 장경호, 연질발 등 토기류와 철촉, 철겸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다. 삼국시대 封土墳
시굴조사 당시 봉토분으로 추정되는 유구는 모두 40여기였으나,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된 봉토분의 수는 20여기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요인으로는 첫째, 자연지형이 마치 봉토분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점, 둘째,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교란으로 인하여 봉토처럼 주변 흙이 이동되어 쌓여있었던 점 등이다. 특히 1차조사구역의 경우 시굴조사 당시에는 모두 18개의 봉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식적인 조사를 통하여 모두 4개의 봉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봉토분으로 확인된 4기 이외에도 봉토분이었을 유구도 더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경우 봉토는 이미 완전하게 삭평된 상태였기 때문에 발굴조사는 일반적인 소형분묘의 조사방법을 채택했다.
봉토분 조사는 먼저 도굴이나 후대의 교란으로 인하여 원위치를 이탈한 흙과 돌을 우선적으로 제거한 뒤 사진촬영을 실시하였으며, 봉토는 일반적 조사방법인 4분법으로 구획하였다. 구획된 십자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일정한 깊이를 파내려 가면서 봉토의 현상을 확인 및 기록하였다. 封土 아래 10㎝~20㎝정도에서 분묘에 사용된 벽석들이 확인되기 시작했으며, 확인된 벽석들을 통하여 볼 때 하나의 봉토내에는 각 2기씩 나란하게 배치된 수혈식석곽묘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1차조사구역에서 확인된 4기의 봉토분 가운데 2기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1차 및 2차조사구역에 분포하는 봉토분들은 주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북-남동쪽으로 2~3열로 열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봉토분들의 직경은 대체로 7m~12m, 벽석상단 또는 개석면에서부터 봉토의 높이는 약 10㎝~30㎝ 정도이다.
라. 고려, 조선시대 토광묘
1) 1호묘
2호묘(석곽묘)에서 북쪽으로 약 410c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조선시대 토광묘이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파고서 설치하였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자연 경사로 인하여 유구의 상부가 대부분 유실되고 현재 확인되는 묘광의 크기는 212㎝×58㎝×58cm 정도이다.
목관은 관정의 노출 상태로 보아 묘광의 양장벽과 북서단벽에 붙였고, 남동단벽은 묘광과 약 15cm정도 떨어져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목관의 크기는 190㎝×52㎝×58cm 정도이다.
묘광의 내부는 암갈색, 황갈색, 회갈색의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청동시 1점이 바닥면에서 약 30cm정도 떠 있는 상태로 노출되었다. 유물은 관정 14점과 청동시 1점이 출토되었다.
2) 3호묘
2호묘(석곽묘)에서 북동쪽으로 약 350c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고려시대 토광묘이다.
묘광은 풍화암반면을 등고선 방향과 약 40~45°정도 엇갈리게 하여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하였다. 자연경사로 인하여 유구의 상부가 유실되어 현재 확인되는 묘광의 크기는 178㎝×68㎝×20cm정도이다.
묘광의 내부에는 암반편이 소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점성이 강한 황갈색 사질점토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유물은 북단벽에서 소형의 외병 1점, 머리 뒤꽂이 1점, 관정 9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가운데 머리 뒤꽂이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며, 침향은 북쪽이다.
2. 유물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목곽묘에서는 양이부호, 단경호, 파배, 노형토기, 연질발, 철모 등이며, 석곽묘에서는 고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완, 이식, 철촉 등과 35호 묘에서 출토된 망치, 집게와 같은 단야구도 출토되었다. 한편 고려․조선시대 분묘에서는 자기류 및 관정, 숟가락(匙) 등이 출토되었다.
Ⅴ. 조사성과 및 의의
1. 본 발굴조사의 성과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구의 서부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특히 주변유적인 竹谷里古墳群, 城山里古墳群, 汶山里古墳群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삼국시대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위치를 규명하는데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양이부호 및 승석문 단경호의 출토(43호묘) 등으로 보아 유적의 초기 형성은 4세기 전반 이후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분묘들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에 축조된 점으로 보아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본격적인 진출은 이시기를 전후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3. 석곽묘(15호, 55호묘)에서 각각 외절구연단각고배, 고령양식 고배 등이 출토되어 토기의 교류를 통한 교역 등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이 지역에서만 보이는 특수형식의 토기류도 다수 확인되므로(대표적인 예로 무투창고배) 토기의 생산과 소지역 문화권에 관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4. 至近에 위치하는 문산리고분군은 분묘의 대형화 및 산성의 존재를 통해 볼 때 이 지역의 최상위집단과 관계된 유적으로 생각되며, 문양리고분군은 문산리고분군을 축조한 집단보다 下位集團으로 생각된다. 특히 兩 古墳群은 낙동강서쪽의 星州地域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군사적인 방어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집단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
|

|
|
유적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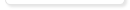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7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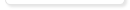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22, 27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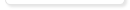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36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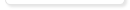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43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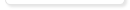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77, 78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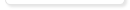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85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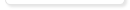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85호 유물 노출 상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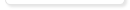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90, 91, 92호 전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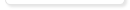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7호 출토 유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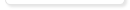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92호 출토 유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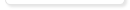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

|
|
117호 출토 유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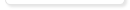 |
|